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기시감(旣視感).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섬광처럼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린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브리핑 영상에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경고 자막을 넣겠다는 발표는, 우리에게 그런 기묘한 정치적 데자뷔를 선사한다. 풍경은 분명 ‘지금, 여기’인데, 그 안의 배우와 대사가 놀랍도록 낯익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펼쳐지던 ‘도어스테핑’이라는 한 편의 연극을 기억해 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매일 아침 기자들 앞에 섰다. 무대 조명과 카메라는 화려했지만,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낳고, ‘불편한 질문’이 쏟아지자 무대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결국 권력은 그 소통의 공간에 물리적인 ‘가벽’을 세우는 것으로 시끄러운 막을 내렸다. ‘소통’을 하겠다며 열었던 문을 스스로 닫아걸었던,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코미디의 속편을 보고 있다. 무대와 배우는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는 ‘쌍방향 브리핑’이라는 더 세련된 무대를 설치하고, 전임자보다 훨씬 능숙하게 ‘소통하는 척’ 연기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파격적인 연출은, 마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보란 듯이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연극의 본질은 무대가 아니라 서사(敍事)에 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놀랍도록 똑같은 플롯을 따라간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자, 그들은 돌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벽’이라는 물리적 장벽으로 자신들을 보호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을 꺼내 들었다. 어쩌면 후자가 더 교묘하고 악랄하다. 닫힌 문은 그것이 ‘닫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저 너머에 불통의 권력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솔직함이라도 있다. 하지만 화면 속 작은 경고 자막이라는 디지털 창살은, 열려 있는 듯 보이는 공간에서 국민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영혼을 서서히 질식시킨다. 눈앞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물리적 차단이지만, 마음속에 ‘고소당할 수 있다’는 공포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심리적 통제다.
결국 두 정권은 같은 병을 앓고 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오만, 그리고 비판에 대한 면역력 없는 취약함이다. 소통을 ‘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여길 뿐, 그것이 때로는 칼날 같은 비판과 불편한 조롱을 감내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소통은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니라, 잘 통제된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쇼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무대를 폐쇄하거나 관객을 겁박하는 길을 택한다.
윤석열의 닫힌 ‘문’을 비웃던 그 자리에, 이재명은 더 촘촘한 ‘창살’을 세우고 있다. 이름과 얼굴만 바뀌었을 뿐, 권력이란 괴물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중의 입을 막으려 한다. 이 섬뜩한 데자뷔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을 맞이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똑같은 연극의 배우만 바뀐 채로, 다음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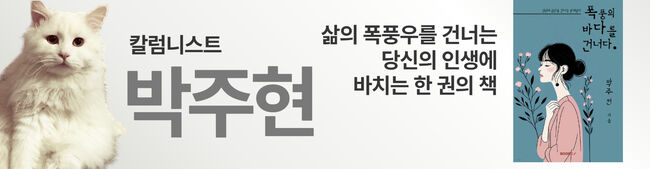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비루한 권력자들. 반드시 끝은 있을 거에요.


막산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독재자의 말로는 상상에 맞기고ㅋ


윤석열. 이재명은 놀랍도록 닮았어요.
이재명이 윤보다 조금 더 교활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