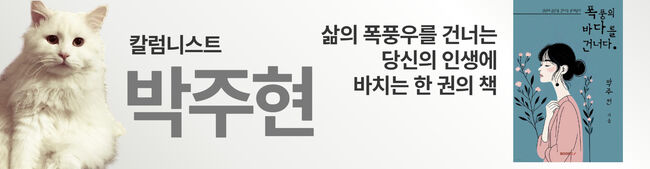▲< 그래픽 : 박주현 >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장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충돌의 최전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은 진실보다 그럴듯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수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진실의 경계마저 넘어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론자'로 불린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있다. 다수가 향하는 방향이 아닌,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다수 의견을 이끌었다. 9명의 대법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어쩌면 원칙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홀로 서 있을 때는 외롭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곁으로 모여드는.
진보진영이라 평가받는 이흥구와 오경미 대법관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올 것이다." 백번양보해 그들의 우려도 이해할 만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자칫 법정이 정치 토론장으로 변질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적어도 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신속했다. 항소심 선고 후 36일 만의 결정이었다.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정의가 부정되는 것이라는 법언처럼, 법의 시계는 정치의 시계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판결이 던지는 의미는 더욱 무겁다.
우리는 흔히 법과 정의를 혼동한다. 법이 곧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를 향한 최선의 도구는 법이다. 한스 켈젠이 말했듯, 법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도 아니다. 다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정이 정치의 장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아마도 법의 존엄성과 신뢰일 것이다. 인간은 법을 만들었지만, 법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법이 정치적 도구가 될 때,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관계는 늘 복잡했다. 한때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 불렸고, 때로는 정치적 계산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어떻게 기억될까? 원칙과 법리에 충실했던 순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의 사례로? 그것은 아마도 역사가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어쨌든 오늘, 대법원은 말했다. 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적어도 오늘만큼은.